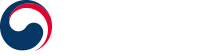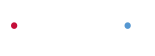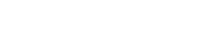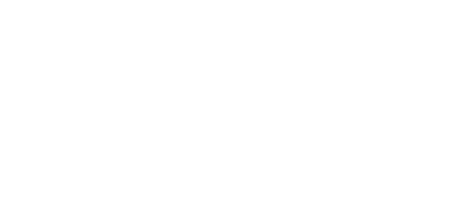
상담실
지니에게 궁금한점이나 고민을 올려주세요.
| 제목 | 밍키넷 91.yadongkorea.click ジ 밍키넷 주소찾기ヰ 밍키넷 접속ン | ||
|---|---|---|---|
| 등록 | 25.10.15 13:20 | 작성자 | 차현정남 |
| 첨부 | |||
|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차 하청노동자 김충현이 사망했다. 동료들은 그를 기억하며 거리에서 싸웠고, 발전소의 변화를 요구했다. 그 사이 불법파견 소송에서 승리했고,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가 출범했다. 트라우마 치료를 받은 노동자들은 다시 일터로 돌아갔다.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예전과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지금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가 변하지 않은 현장의 기록을 전한다. <기자말>
[정철희] 김충현 사고 이후, 발전소의 시간은 흐른다 지난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 정비 현장에서 김충현(48) 씨가 선반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그는 한전KPS 하청업체 소 건강보험 속 정비 노동자였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자가 없었고, 위험 설비 방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험 작업은 2인 1조로 해야 하는데 그 원칙도 위반했다. 중대한 안전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원청이자 작업지시자는 한전KPS였다. 사고 이후 선반 작업은 잠시 중단되었지만, 발전소의 시간은 곧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살인적인 여름의 대출인 폭염 속에서 동료인 우리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의 외주화'와 '책임의 외주화'를 세상에 알리고자 싸워왔다. 한전KPS의 불법파견 문제를 법적으로 밝히기 위해 소송에 나섰고, "누군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으로 매일 자리를 지켰다. 불법파견, 그리고 1심 승소 김충현이라는 한 노동자의 죽음은 오 알티전자회생절차 랫동안 이어져 온 불법파견 구조의 민낯을 드러냈다. 하청노동자들은 원청인 한전KP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법원은 1심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8월 28일,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한전KPS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일했다"며 한전KPS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그 승소 이후로도 50여 일이 흘렀다. 끝나지 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조건 않을 것 같던 폭염도 물러갔지만, 현장의 공기는 여전히 뜨겁고 무겁다. 동료들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다시 일터로 돌아왔다. 그간의 시간은 슬픔을 추스르고 부족했던 안전관리 시스템을 고치기에 충분한 시간이어야 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온 현장은 참담했다. 다시 돌아온 현장, 변화는 서류 속에만? 파산선고확인 ▲ 김충현 노동자 사고 이후 폐쇄된 선반작업장 사진 ⓒ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사고 이후 100일이 지난 9월에 동료들과 함께 현장으로 복귀했다. 우리를 맞이한 건 침묵 뿐이었다. 노동자들이 기대했던 새로운 안전 교육도,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도 없었다. 회사는 평소처럼 돌아갔다. 다시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 현장의 필수 안전 수칙을 찾아보고, 응급처치법과 감전 사고 대응 영상을 시청했다. 안전이 제도의 몫이 아닌, 개인의 생존 기술로 전락한 현실이었다. "오로지 사무실의 문서 속에서만 변화가 있죠. '개선'이라는 단어는 서류에만 존재합니다." 사고 이후 산업계와 정부는 대책을 내놓았다.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가 구성되고 원청·하청·노동부가 참여하는 회의체가 만들어졌다. 보고서에는 '안전관리 강화', '하도급 구조 개선'이라는 문구가 빼곡히 적혔다. 그러나 현장은 그대로라고 본다. 새로운 절차는 종이 위에만 존재했고, 작업대 위에서는 여전히 위험한 공정이 이어졌다. 심지어 함께 일하던 KPS 직원들과의 관계도 무너진 듯하다. 불법파견 소송에서 이긴 뒤부터, 노동자들은 원청의 '불편한 존재'가 되었다. 현장은 돌아왔지만, 관계는 끊어졌다. 우리는 언제쯤 안전해질 수 있을까 100일 동안 노동자들은 사고의 트라우마와 불안을 견디며 다시 공구를 들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없었다. 여전히 비자격자가 비계를 쌓고, 위험천만한 고압 전선을 맨손으로 다룬다. "다시 누군가 다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이 말은 체념이 아니라, 현실의 진술이었다. 충현이 형이 떠났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언제쯤 안전해질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누구에게도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오늘도 다시 현장으로 향한다. 두려움과 책임, 그리고 생계를 품은 채로. 덧붙이는 글 |
|||